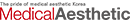메디컬에스테틱에서 두 달 동안 인턴 생활을 했던 텍사스 휴스턴에서 온 의대 지망생, 프레슬리 존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글과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22살의 프레슬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누구에게든지지 않으려는, 텍사스를 미국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에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앞으로의 미래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8월 23일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벌써 8주 넘게 서울 마포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 공항에서 도착한 서울에서의 첫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서울과 텍사스 휴스턴의 14시간 시차 때문에 정말 일찍 일어났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난생처음 아침형 인간이 되었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서울의 운전자라는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작은 골목길을 건너고 있는데, 제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차가 항상 사람으로부터 6피트(약 2m) 이상 떨어져 있는 미국의 '보행자 우선' 사고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몇 주 동안 한국에는 정지 신호가 없고, 인도에 차를 세우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와 오토바이/스쿠터 운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난폭한 운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보행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업무상 자동차를 더 자주 타게 되면서 서울에서는 운전자가 될 수도, 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도로에서 용감하게 운전하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용기와 주차 능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금방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모든 음식이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맛있었어요. 미국의 대부분 음식이 매우 무겁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이 음식의 품질이나 음식에 넣는 재료(예: 발암 물질로 알려진 적색 염료 40)에 대한 제한이 적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음식이 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멕시코 음식이 그리웠지만, 집에 돌아가면 이곳의 음식이 많이 그리울 거라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김치를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업을 듣고 김치 만드는 법을 연습했으며, 김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문화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울 최고의 피부과 의사분들과 클리닉을 둘러보거나 시술을 참관한 후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죠. 두 경우 모두 좋은 음식과 음료가 만들어내는 개방성과 친밀감으로 인해 매우 재미있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턴십 기간 동안 서울의 피부과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안과 의사 밑에서 일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응급의학과 눈 건강에 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눈 건강이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눈 건강이 신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 취업 전에는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것을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거의 접하지 못했던 전문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턴십 전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가 기술적으로는 매우 흥미롭지만 다른 의학 분야만큼 중요하지 않고 피상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제가 가진 매우 피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많은 의사 및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술을 직접 참관하고, 실제 환자들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피부 상태가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실제 이미지와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배우고 관찰했습니다.
또한 운이 좋게도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몇 가지 다른 전문 분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세 번 중 두 번은 저나 제 친구 중 한 명이 환자였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의 경우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함께 가서 외국인을 위한 국제진료 클리닉 구역에 갔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크고 매우 바빴다. 미국에도 우리만큼 큰 병원이 있지만, 이렇게 바쁘고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하루 평균 진료하는 환자 수가 미국의 대형 병원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에스테틱과 관련 없는 두 번째 임상 경험은 제가 환자로 참여한 내과 클리닉이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저에게는 훨씬 더 두려웠고, 특히 두 번째 진료는 혼자 갔을 때 후속 조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와 제 친구의 경우, 전반적인 진료 과정이 미국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처음 내과를 방문했을 때 진료비는 약 3만6천 원이었고 처방받은 약값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으면 이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저렴한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가 최대 5천 원까지만 청구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이 정도 비용에 화를 낼 것이라고 한국 상사에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 병원의 응급실을 둘러보고 그곳의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자원봉사와 응급실 근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응급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가보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지역의 위치와 인구 밀도에 따라 5~30개 사이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자기 방에서 자기만의 침대를 사용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중환자실은 커튼으로 큰 방 하나를 네 구역으로 나눠 훨씬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각 구역에는 10개의 침대가 있었고 각 침대 사이에는 약 5피트(1.5미터)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관찰한 한국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환자 간 교차 감염이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이러한 설계가 환자와 병원 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 이후 중환자실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팬데믹이 실제로 병원과 중환자실 설계에 대한 질문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중환자실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격리된 병실이 있는 미국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의문이자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한국의 중환자실 환자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한국의 해결책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히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미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페인어를 부전공했고, 많은 병원과 상점,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 영어만 사용하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환자들과 심지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느낀 동정심이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되었지만, 이곳에서 일한 후에는 동정심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훌륭한 사람들, 보고 배운 환상적인 것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들 중에서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더 나은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람, 더 공감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편집장의 에필로그
프레슬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엘비스 광팬이라 생긴 이름입니다. 22살의 백인 여성과의 두 달 동안의 함께하면서 편집장을 비롯한 임민구 기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 되는 영어를 억지로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는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떠난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프레슬리가 알려준 미국 생활 영어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로 식사 시간에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해서, 음식과 관련된 단어가 많네요,
Tipsy: 우리말로 ‘알딸딸하다’ 정도의 표현인데요, 프레슬리는 데킬라와 위스키를 즐기는 텍사스 여성답게 소주가 물 같다며 무조건 원샷이었습니다. 그럴 때 괜찮냐고 물어보면, tipsy!
Big Meal: 점심을 샌드위치나 사과 정도로만 때운다는 프레슬리는 한국의 점심이 꽤 거했나 봅니다. 배부르게 점심을 먹은 후 졸립다고 하고 프레슬리는 항상 ‘Big Meal!’이라네요.
Hit the spot: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메뉴가 딱 맞는 것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프레슬리는 쉑쉑버거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감자는 그녀가 유일하게 먹는 야채!
Wives' tale: 엄마들이 하는 말이라는 표현. 예를 들어 한국에는 ‘불 장난 하면 오줌 싼다’, 미국에는 ‘수박씨 먹으면 뱃속에서 싹이 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Nag: 프레슬리의 술버릇은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오빠도 인정한 사실. 술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물을 많이 마셔라, 속이 안 좋을 수 있으니 크래커를 먹어라(크래커를?), 운전하지 마라 등등, 대부분은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녀의 Nag이 그립습니다!


As August 23rd creeps closer, I cannot believe my time here in South Korea is coming to an end. I have been here in Mapo-gu for over 8 weeks. At the start of my internship this seemed like such a long time, but now that I am at the end, I wish I had more.
I still remember my first day in Seoul, after arriving from the airport late the night before. The 14 hour time zon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Houston caused me to wake up really early (something my Dad would be proud of I am sure), an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was a morning person. Disoriented and jet-lagged, I made my way out of the hotel to head to orientation. That’s when I had my first culture shock and unlocked a new fear: drivers in Seoul. As I was crossing the small alleyway street (with no pedestrian walk light), the car did not stop and kept going despite me walking across the road. This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edestrian first” mentality of the US that I was used to where cars stayed at least 6 feet (~2 meters) away from people at all times. Over the weeks, I learned that there were no stop signs in Korea, cars could often drive and park on the sidewalks, and the taxi and motorcycle/scooter drivers were the craziest drivers of all here. Eventually I started to adjust to my new role as a pedestrian in South Korea, however, as I rode in cars more often for work, I do not think I could be, or want to be, a driver in Seoul. To all those that often brave the roads of Seoul, I admire you for your courage and parking abilities.
Something else I discovered very quickly after arriving here: all of the food was good. Literally every place I went to was delicious, no matter the type of cuisine. I don’t know if it’s because most of the food in the US is very heavy or because the US has less restrictions on food quality/what they put in food (For example, Red Dye 40, a known carcinogenic), but everything here just tastes fresher in general. I miss Mexican food while I am here, but I know once I go home, I am going to miss so much of the food from here. For example, I have already taken a class and practiced how to make kimchi because I know that it will be much harder to find in the US, and it is one of my favorite side dishes here. One of the things I really enjoy about food is, regardless of culture, it is an activity where people come together. I have met and gotten to know so many people over a meal. Sometimes, I would be sharing some tteokbokki with a friend after work and talking about our day, other times, I would be dining with some of the best aesthetic doctors in Seoul over a fancy dinner after touring their clinic or observing a procedure performed by them. In both cases, there is a certain openness and closeness that good food and drink creates that allows for some very fun and insightful conversations.
I’ve learned alot about the field of dermatology in Seoul in particular during my internship. During college, I worked under an opthamologist, got certified as an EMT, and volunteered in the ER, so my main experiences pertained to emergency medicine and eye health. From my job in particular, I learned just how important the health of our eyes is for our quality of life and how much it can tell us about the overall health of the body, something I was not quite fully aware of in its depth before my employment. Similarly, from the dermatologists and plastic surgeons I talked to during my time here, I learned a lot about a specialty to which I previously had very little exposure. Before this internship, I perceived the medical aesthetic field as very technically interesting, but predominantly superficial and not as vital as other fields of medicine. This, ironically, was a very superficial viewpoint for me to have. After getting the chance to speak with many doctors and experts in the field, watch operations myself, and talk with and meet some of the actual patients, I got a glimpse into just how much the condition of a person’s skin can indicate about the overall health of a person. In addition, I learned and observed first-hand how someone’s actual and self-perceived image can affect both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well as their quality of life.
I was also fortunate enough during my time here to get the chance to see a couple other medical specialties at work, though, two out of three were for me or one of my friends as patients, so perhaps this is not so fortunate. For my friend, I went with her to Yonsei Severance Hospital where we went to the international care clinic area for foreigners. My first impressions— very big and very busy. In the US, we have hospitals just as large, however, I have never seen any of them as busy and with as many patients at once. It seems that an average day at a large hospital in Seoul sees as many patients as a large hospital in the US during a crisis.
My second non-aesthetic related clinical exposure was an internal medicine clinic with me as the patient. There was no special area for foreigners in this clinic, so this one was a lot more intimidating for me given my very limited Korean speaking skills, especially the second time for my follow-up when I went by myself. In the case of my friend and myself, we observed that the overall process of the visits were much more efficient and quick then what we were used to in the US. It was also a lot cheaper for us, even without insurance, than our experiences back home. For my first visit to the internal medicine clinic, the cost of my visit was about 36,000 KRW, and the cost of my prescribed medicine was about the same. This is pretty cheap for me considering I would pay this much or more with insurance in the US, but my boss told me that many Koreans would get upset being charged this much because with the Korean National Health Care, it maxes out at 5,000 KRW for visits like that.
Lastly, I had the opportunity to tour an emergency room in a medium sized hospital and speak with one of the physicians there. From my volunteering and EMT experiences in the US, I found the ERs here very similar to the ones back home. However, when I went to the ICU, it was a different story. In the US, the number of beds in the ICU ranges between 5-30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population density of the area. Each patient gets their own bed in their own room. The ICU I saw here in Korea though was much more open, with curtains separating one large room into four sections. Each section had 10 beds with about 5 feet (1.5 meters) between each bed. I was honestly a little surprised to see this layout in South Korea with the levels of advancements I have observed during my time here. As someone who has worked in health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ne of my first concerns was cross-contamination between the patients. How did this design affect patients and hospital staff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and have there been any effects on the procedures of the ICU post- Covid? I learned shortly thereafter that the pandemic had indeed begun to influence questions and thoughts of hospital and ICU designs here to perhaps become more like those of the US, with individual, isolated rooms for each ICU patient. However, one question and possible concern I have for this is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atients in the ICU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 do not have an answer, but I am curious and anticipating South Korea’s solution. Overall, my time here in South Korea has changed my perspective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was completely placed in the minority culturally, racially, and linguistically. In college, I minored in Spanish because it is the second most spoken language in the US after English, and I had observed first-hand the struggle of many patients and even my friends’ parents to communicate with English-only speaking staff at many hospitals, stores, and even teachers at schools for their children. My sympathy after observing situations like these motivated me to learn Spanish, but after my time here, I not only have sympathy, I also have empathy. Out of all the wonderful people I have met here, all the fantastic things I’ve seen and learned, and all the lifelong memories I have made, I feel like this aspect of empathy was the most valuable thing I gained from this experience— not only making me a better physician some day in the future, but also just making me a better, more empathetic and aware, human overall. I am grateful to have gotten this opportunity to learn and to experience this beautiful country.